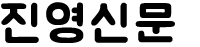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이야기(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0,377회 작성일 20-12-24 06:21본문
투명하고 깊은 인디고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드리운 송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여인은 강원도로부터 탈출한 자신이 충분하게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에 그 남자는 있어야 할 곳에서 없었다.
같은 장소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한 커풀의 포유류 동물을 부부라고 호칭한다면 그녀와 강원도의 그 남자와의 사이는 사뭇 다른 이종 사이었다. 그녀가 백조라면 그 남자는 늑대였다.
그녀가 왜가리처럼 소리 지르면 그는 승냥이처럼 날뛰었다. 그 남자의 주위에는 다양한 여자가 많았다.
그 남자는 사납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낮고 부드러운 목청도 소유하고 풍부한 성량을 바탕으로 한 고급스러운 노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나움은 시골 대학의 교수짜리가 그에게는 부족해서 인지도 몰랐다. 사나운 늑대의 갈기에는 암컷의 터럭도 간혹 묻히고 들어왔다.
오늘 아침 고니는 호숫가에서 머무는 대신 이곳까지 흘러와 버렸다. 빠른 시간에 멀리 오느라고 발이 짓무른 모양이었다.
두 무릎을 세우고 무릎사이에 얼굴을 고이고 한참동안 발목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걷기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송씨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목을 고추 세우고 일어선 그녀를 보았다.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놀란 송씨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사연이 담긴 습윤 가득한 눈과 아름다운 입술을 보고 송씨는 다시 쭈그려 앉아서 넓은 등짝을 그녀에게 들이댔다.
여자는 노랗게 익은 벼를 배경으로 생각에 잠겨서 쭈그려 앉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세상에 순수하고 성실한 사내도 있다는 것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욱한 기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송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발목은 간교하게도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발목 쪽으로부터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이내 그의 등짝이 아닌 어깨에 기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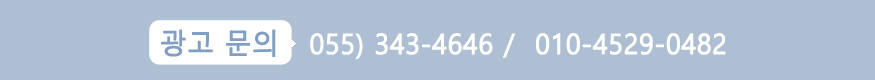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