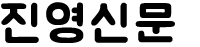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사람들 (3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2,521회 작성일 21-03-18 06:17본문
아랫마을사람들 -39-
금희의 운전솜씨는 탁월했다. 그녀가 오른손 팔굼치를 의자에 얹은 채 뒤 창문 너머로 장해물을 내다보면서 후진하는 모습은 보는 친구들은 매번 감탄사를 날렸다. 왼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액셀을 밟아 차를 신속하게 후진시키는 모습은 트럭운전수처럼 익숙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동승할 때는 매번 박수를 치며 금희의 운전 솜씨에 호응 했으나 그녀의 부친 최병무 만은 오금을 저리고 마음을 놓지 못했다.
이따금 금희의 옆자리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는 그녀의 남편은 태평해 보였었다. 평정심을 가지고 지긋이 눈을 감는 그녀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인의 운전하는 옆모습을 일별도 하지 않은 채 안전띠를 채우고 이내 머리를 의자뒤에 붙이고 눈을 감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아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었다. 금희의 남편은 세상과 먼저 이별하기 전에 그녀와 먼저 이별했다. 그는 아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남편친구들은 이례적인 부부로 생각하고 애교스럽게 덕담을 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했었다. 이제 그는 아내의 손에서 벗어나 시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지도 몰랐다. 어쩌면 아내와의 짧은 별거에 행복을 즐기기도 전에 세상 저쪽으로 건너가 더 넓고 깊은 행복의 바다에서 오래도록 부유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제 금희는 옆자리에는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금희는 자신의 생각으로 충분하게 세련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사교성에 부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하여 집을 떠난 후 다시 귀가한 그녀의 친구들은 흔하지 않았으며 고향에 남아있는 그녀의 친구들도 결혼 이후의 서로가 지내 온 시간의 간극이 벌어져 있었다. 통상적인 그녀의 친절에도 그녀를 익숙하게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호의를 피했다.
금희는 길모퉁이의 미루나무를 돌기위해 핸들을 꺾자 먼지 낀 차창 밖으로 낮선 사내가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어쩌자는 것인지. 금희는 차를 벌컥 세우면서 차창사이로 고개를 빼끔이 내밀었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이곳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사람처럼 친근한 표정으로 길을 물었다. 말쑥하게 입은 양복 속에는 셔스가 밝은 톤의 조끼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입은 상의는 세 종류의 다른 킬라와 무늬가 묘하게 다투고 있었다. 골격이 뚜렷한 몸통에 자리 잡은 그의 얼굴과 목울대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당연히 차에 태워줄 것을 예감하며 금희 에게 길을 묻는 그의 목소리가 경쾌했다.
그는 경희가 이장댁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작정하고 이장 댁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금희는 남자를 다시 뜯어보았다. 탄력 있는 그의 목소리로 미루어보아 그는 입담으로 먹고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면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일가. 그의 목소리는 관리가 잘되어 있었다.
경계심을 가진 금희의 시선 너머로 그가 들고 있는 간행물 잡지의 커버에 눈길이 미쳤다.
잡지를 말아 쥐고 있는 그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의 몸통과 다르게 힌 손가락은 정결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잡지의 표지는 그의 직업을 암시하듯 일러스트를 활용한 음악의 음표부호의 무늬가 표시되어 있었다. 금희는 불현듯 그가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는지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키가 크고 우람한 그의 몸통은 평소에 남자들을 향한 금희의 호감과 대응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힘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를 차에 태운다면, 그리고 옆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가 앉은 후의 좌석에 기댄 머리통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가 생각했다. 금희는 이름 모를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서 머리통을 의자에 기대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지껄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금희는 오랜만에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와 사람을 현혹시키는 언어의 질감을 가늠해 보고 싶었다. 그의 뒤로 미루나무의 겻 가지의 잎 새가 잔망스럽게 자신의 몸을 흔들고 있었다.
자신의 부친인 최병무 이장은 이미 오래전에 퇴임하고 있었으나 마을사람들을 아직도 그를 이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금희는 어느 이장을 찾느냐고 묻지 않았다. 바로 부친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그는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금희의 육감적인 입술을 열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답변은 “모르겠는 데요” 였다.
그녀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키 크고 잘생긴 사내에 대한 그녀의 저항감뿐만 아니었다. 이장댁에는 은희가 있었다.
은희 친구인 경희도 있을 것이었다. 거침없이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와 그녀의 성품과 함께 응고하여 둥지를 틀고 굳어버린 원초적인 질투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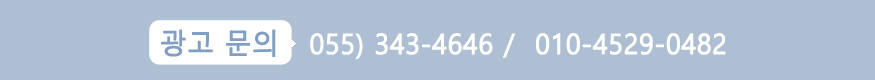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