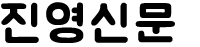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이야기(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0,480회 작성일 21-01-15 21:16본문
아랫마을 이야기 -26-
금희는 괄한 불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바비큐의 꼬챙이에서 야채와 고기 조각을 뽑아 프라이팬에 넣었다. 최병무는 큰딸 금희에게 물었다.
왜. 바비큐가 마음에 안들어?
금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데쳐진 파브리카를 집어 아빠의 코앞에 내밀었다.
미세먼지인가 탄소인가가 발생한데요, 하자 금희는 힐끗 경희를 바라봤다.
프라이팬에 알맞게 익도록 고기조각을 세세히 뒤집어 최병무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경희의 음식 수발하는 옆모습을 보던 최병무는 갑자기 저세상으로 가버린 처가 생각났다. 그녀는 걸핏하면 큰딸 금희에게 ‘저년은 구렁이처럼 지 몸은 육실하게 위하네, 하고 타박을 주었으나 정작 자기 몸은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뜬 것이었다. 그녀는 고기가 익으면 항상 고기조각을 뒤적여 남편 앞에 밀어놓고 자신은 남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희를 보고 최병무는 잊고 있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나무젓가락을 쥔 경희의 힌 손을 바라보며 최병무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함께 먹자. 알맞게 익었구나.
함께 먹자는 말은 오랜만에 최병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함께 라는 흔한 단어가 따듯함을 담고 독특한 톤으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금희는 고기조각을 뒤집는 경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빠에게 눈길을 주었다.
경희의 힌 손을 바라보고 옛 추억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려는 최병무는 화들짝 놀라 눈을 질끔 감았다.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혼자 살아 아무리 궁박한 처지이지만 작은딸의 손님인 경희를 보고 아내를 떠올려 생각해낸 것은 망발이었다. 큰딸 금희가 힐끗 자신을 일별한 것을 보아 큰딸에게 자신의 허약한 마음을 들킨 것 일가.
최병무는 포도주잔을 들어 등불에 술의 빛깔을 비추어 보고 이내 입을 대고 액체를 빨아 당겼다. 대경실색한 최병무의 마음을 다독거리기는 커녕 맑고 붉은 액체는 그의 혀를 진동시키고 제멋대로 풀어놓았다. 그의 혀와 목구멍은 서로 다투며 포도주를 재촉했다. 최병무는 바쁘게 목 울대를 울리며 술을 넘겼고 목을 넘어간 술도 함께 보채었다. 취할수록 마음은 더욱 헛헛했다. 그는 술잔을 놓고 일어섰다. 각자의 둥지 속에서 쉬는 친구들을 불러낼 작정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졸지에 불려나와 그의 주정을 올 곳이 받아드려야 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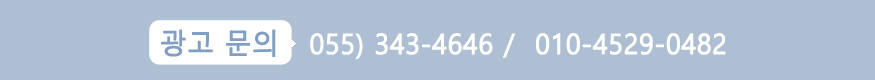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