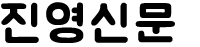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사람들 (3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2,625회 작성일 21-02-01 01:47본문
아랫마을 사람들
-32-
최병무는 숙취를 뜸들이기 위해 눈을 뜨고도 잠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누워서 창가의 화분으로부터 눈을 뗀 그는 누렇게 색이 바랜 벽 위에 액자를 바라봤다. 액자 속에서는 천국으로 가버린 그의 처가 늙어버린 최병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병무는 속으로 궁싯거렸다.
‘임자가 가고 없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뭘 할 수 있을가’
그녀와 최병무는 바지런했다. 농사를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절에 마을에서는 솜씨 좋은 그의 손길이 요긴하게 필요했다. 그는 인근마을에서 머슴이나 진배없었다. 그러나 남의 일에 손을 빌려줄 때 그는 맨 입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가를 받고서야 일을 해주었고 왁살스러운 그의 품세에 비해서 일솜씨는 여축이 없었다.
최병무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처였다. 그의 살림이 세월이 갈수록 탁탁해져가는 데에는 그녀의 헌신적인 응원 때문이었다. 마을사람들은 불뚝거리는 놈이 색시는 잘 얻었다고 했다. 그랬다. 사람의 팔자는 잘 맺어진 인연에 의해서 구겨지기도 하고 펴지는 법이었다. 얌전한 새댁은 신혼 당초부터 최병무의 모가지에 목줄을 걸었다.
조용한 그녀가 젊은 최병무의 마음을 초장부터 움켜쥐고 헛발질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조섭을 하고 길들이는 것을 마을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밖으로 나돌지 못하고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최병무는 보이지 않는 목줄을 맨 강아지였다.
그 강아지는 마냥 행복했다. 밖으로 나돌지 못하는 그 강아지는 친구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또래들의 최병무 친구들은 밖에서 개판을 치는 대신 집안에서 벌리는 유희가 경제적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사적으로 격식을 갖추어갔다.
그러나 담백하고 꾸밈없는 친구들이 모여서 즐길 것이라고는 고스톱과 술판을 벌리는 일이 전부였다. 그들은 오롯한 파티를 즐기기 위해 어느 날 최병무의 집에서 모였다. 고스톱의 판이 한창 무르익어 절정에 다다랐다. 집주인 최병무는 배팅하기 위해 부족한 돈을 구하려고 안방으로 잠간 자리를 뜬 사이에 최병무의 처는 당돌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고스톱을 하려거든 앞으로는 우리 집에 모이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고 똑 부러지게 선언했다.
그 후로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유희에 모가비 노릇하는 최병무를 뜨악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오롯한 파티는 쫑이 났다. 최병무는 이유를 몰랐고 친구들은 원인을 발설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처에게 홀대를 받고 사는 최병무가 애처로워 보였지만 정작 그의 밤은 풍요롭고 현란했다. 그는 조용하고 나긋하게 감기는 그녀의 지순한 사랑에 취해 행복했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 이었다.
부지런한 최병무는 모이는 돈으로 할수있는 일이라고는 땅을 구입할 방법 밖에 없었다. 그가 사 들인 땅은 그의 거실 천정에 흩 뿌려져있는 파리똥처럼 도처에 널려있어서 그도 헤아리기가 부지가수였다.
낮과 밤이 함께 고달파도 최병무는 그 시절이 그리웠다. 최병무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잠을 청했다. 그는 이불을 턱밑까지 끌어올리고 뒷머리에 지긋이 힘을 주어 베개를 눌렀다. 그리고 다시 눈을 슬며시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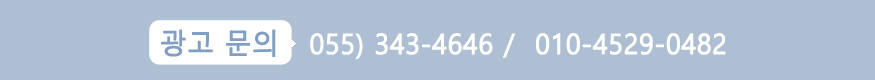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