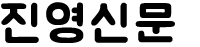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사람들(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1,824회 작성일 21-01-26 05:04본문
아랫마을 사람들
-29-
깊은 밤 내내 문풍지를 울리며 불던 비바람이 겨우 새벽에야 잦아졌다. 송씨는 뒤채이다 늦게 잠들었다. 농사일은 자유업이었으나 자연의 절기와 일기에 의해 간섭받는 농가일이야발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새벽녘에야 잠들어 곤한 꿈길에서 송씨는 낮선 여자가 방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송씨는 눈을 떴다. 경희가 아니었다. 늦은 아침 외 짝문 뒤의 허공을 배경으로 방문을 열어 제킨 금희가 우뚝 서있었다. 송씨는 용수철이 튕기듯이 발딱 일어났다.
마을에서 자주 보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장 댁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장의 큰 따님이었고 이장 댁에서는 경희가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읍내 밖으로 나서는 언덕위의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여자였다. 기가세고 혼자 사는 그녀는 거칠 것 없이 살았다. 넓고 하얀 얼굴과 큰 눈은 아름다웠으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송씨는 괜스레 송구해 졌다. 송씨는 그녀를 어려워해서 시선이 흔들렸다. 이내 송씨가 옷을 주섬주섬 입는 사이에 그녀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쓰윽 흠치고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방자한 행동은 송씨를 얕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이 인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서 한 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세운 다리에 턱을 고이고 송씨가 돌아서기를 기다렸다. 금희의 건강한 허벅지가 희게 내보여졌다. 돌아서려던 송씨는 다시 한 번 시선 둘 곳을 잃어 버렸다. 금희는 송씨가 앉기를 기다렸다. 금희는 스산한 방안 풍경을 둘러보았다. 시렁에 걸려있는 바지는 그러나 정갈했다. 선반위의 상의는 곱게 개켜져 있었다. 흙강아지가 되어 농사지으며 혼자 사는 송씨의 느낌과는 많은 거리가 있었다. 누군가 송씨를 수발하고 있는 여자가 있음이 느껴졌다. 방 귀퉁이의 스툴 위에 놓여 진 유리병에는 붉은 한 송이의 꽃이 담겨있었다.가냘픈 꽃송이는 몸을 외로 꼬고 손님을 흘겨보고 있었다. 금희는 투명인간같이 존재감이 희미했던 송씨에게 새로운 시새움이 일어났다. 송씨가 앉기를 기다려 금희가 용건은 끌러놓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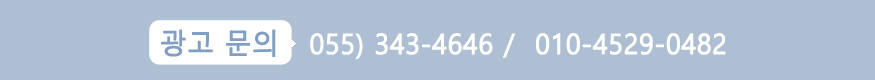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