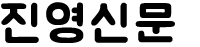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이야기(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1,677회 작성일 21-01-13 01:42본문
아랫마을 이야기
-24-
경수는 차를 세우면서 이번에는 그녀의 입에 눈길을 주었다. 붉은 입술사이로 경직된 말이 흘러나왔다.
“많이 놀라셨지요.”
인사치레로서 경수가 준비한 말 이었으나 그녀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경수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에 그녀는 눈감고 목숨을 버릴 뻔하지 않았는가. 경수는 턱을 핸들위에 올려놓고 은희를 흘겨보았다.
“어쩌려고 눈을 감았어요.”
“천리향 때문에...”
어쩌면 그녀는 보험 사기범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희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이번에도 그녀의 입술을 살펴보았다. 담은 입은 단정해 보였다. 하얀 이는 보이지 않았다. 예쁜 여자였다.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지만 교통사고를 피했다는 해방감 때문에 경수는 실소를 머금고 물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 세상 끝...”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 가게 돼요.”
여자는 낮선 이에게 내면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끄러움을 잠시 느꼈다. 말하는 어조로 보아 경수는 여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눈 여겨 보니 눈빛도 멀리 향하고 있었다. 이 여자를 자택으로 데려다주어야 할 것 같았다.
은희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무심하게 말했다.
“아무 곳이나 꽃집 앞에 내려주세요.”
선술집이 있는 거리의 끝자락에 꽃집이 있던 것을 경수는 생각해 내었다.
작은 트럭은 한참동안이나 들썩이면서 달리다가 꽃집 간판 앞에 은희를 내려주었다.
은희를 내려주고 이내 돌아서 가려던 경수는 그녀가 꽃집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그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사고를 내던지 당하던지 할 것 같아 불안했다.
은희는 꽃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문의 손잡이를 비틀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꽃집은 지하에 있는 모양이었다. 지하는 음습해 보였으나 꽃향기 때문에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햇빛이 반사되는 이웃집 박공을 향해 창문이 배치된 건물 이었다.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채광에 신경을 쓴 결과, 꽃들은 건강하고 용감하게 도열해 있었다. 구매 할 꽃을 작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은희는 꽃을 오랜 동안 고르지는 않았다. 자신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목서는 봉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가운 은희는 은목서의 가격을 지불하고 꽃집 주인은 이내 화분을 포장했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 젊은 여인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멈추고 기다리는 눈치였다. 꽃집주인 화분을 들고 뒤따라 나왔다. 오래된 문은 주저앉아 살짝 들어서 밀어야 열리게 되어 있었다. 화분을 들고 뒤따라온 꽃집 주인은 분을 살짝 내려놓고 놉을 비틀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화분을 들고 앞서 나갔다. 은희도 따라 나섰다. 그러나 먼저 기다리던 여인은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문은 다시 닫혔다. 그녀는 소경인 모양 이었다. 은희는 문을 나서면서도 신경이 쓰였다. 문 밖에는 밝은 햇빛이 내려 쪼이고 있었다. 꽃집 주인이 건성으로 말했다.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하며 그는 화분을 던지듯 내려놓고 길 건너 편의점에서 뭔가 구매하려는 듯 그쪽으로 서둘러 뛰어갔다. 계단이 끝나는 공간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여인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은희는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잠시였다. 큰길로 나선 은희는 화분을 바라보고 숨을 골랐다. 은목서가 담겨 저 있는 화분은 무거웠다. 대책 없이 화분을 들고 걸음을 떼려던 은희는 무심한 듯 경수의 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경수는 오랜 동안 순치된 하인처럼 화분을 받아들었고, 은희는 화분을 건넸다, 잠간사이에 두 사람에게는 내밀한 주종관계가 성립된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는 짜증이 나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작은 트럭의 자리는 둘 뿐이었다. 은목서는 은희가 앉은 조수석 앞에 내려놓았다. 꽃향기는 트럭속을 가득 채우고 창밖으로 넘쳐흘러 나갔다. 냄새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기억을 불러 이끌어 내기시작 했다. 경수는 아버지와 줄기차게 싸우던 지난날의 새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향내를 남기고 결국 아버지와 경수를 영영 떠나고 말았다. 경수는 액세레이터를 밟지 않았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경수의 출발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간혹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은 은희의 귀밑을 스쳤다. 어린아이의 젖 냄새와 상한 냄새가 언 듯 스칠 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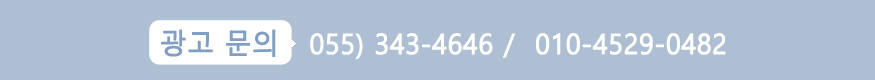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