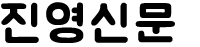아랫마을 이야기 (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0,162회 작성일 21-01-07 02:46본문
은희를 태운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희는 송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드디어 애태우던 송 씨는 경희와 대로에서 함께 걷게 되었다. 마을에서 조성하여 형태가 잡혀가는 둘레 길을 접어들자 경희가 손을 슬며시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송 씨가 미끄러지려는 경희의 손을 잡고 더욱 힘을 주었다. 송 씨의 걸음은 이미 구름위에 둥둥 떠서 보폭의 균형이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경희는 빼내려던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넓은 산길 모롱이를 돌자 자드락길이 나왔다. 호젓한 길이었다. 언덕을 향한 길 같았으나 들어설수록 수풀은 우거져 있었다. 전망 좋은 언덕에 다다를 때쯤 송 씨는 경희의 불편했던 다리에 신경이 쓰였다. 언덕에 오르자 송 씨는 상의를 벗어서 풀밭 위에 깔았다.
어디선가 여치 한마리가 날카로운 금속성으로 처절하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암놈을 부르고 있는지 몰랐다. 한 마리의 여치는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았다.
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절에 의해서 소멸해 가는 운명을 예감한 듯 치열하게 암놈을 부르고 있는 중 일 것 이었다. 짝짓기의 상대가 이미 모두 사라져 버린 것 일가.
경희가 앉은 곳은 전에 송 씨가 가끔 와서 누워봤던 풀밭이었다. 송 씨는 그녀의 상처 난 발이 궁금했다. 운동화의 끈이 풀렀다. 경희의 운동화 속의 하얀 발은 이미 상처가 거의 아물어 가고 있었다. 마음은 순수했지만 갑자기 무슨 망발일가. 상처는 다 아 나았어요? 하며 그는 그녀의 발을 운동화속에서 들어내어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발목에 코를 가져다 대고 싶은 욕망을 어쩌지 못했다. 그는 아득한 정신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동작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숭늉 들여 마시듯 송 씨는 그녀의 발목에 입술을 가져갔다.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신음을 토했다. 그녀는 신음과 함께 쇄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송 씨의 어깨를 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 서슬에 송 씨도 경희의 배 위로 얼굴을 묻고 쓰러지면서 경희의 온몸의 향기를 다시 들여 마셨다. 이윽고 경희는 송 씨의 얼굴을 가슴께로 들어 올려 두 손으로 바쳐 안았다. 송 씨는 얼굴을 들어 경희를 내려 다 보았다. 경희의 입은 반쯤 열려 있었다. 송 씨는 경희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포개기 전에 다시 젖무덤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여치의 금속성 소리를 듣고 송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경희의 열려있는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틀어막았다. 입이 틀어막힌 경희는 거칠게 코로 숨을 쉬면서 다시 전율했다. 급기야 숫보기의 남자보다 익숙한 여인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겁쟁이 말을 다루듯이 그녀는 조심스레 남자를 이끌었다. 남자는 마구간에 처음 끌려 나와 낮선 외출하는 말처럼 조심스럽고 겁이 많았으나 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주었다. 마구간에서 나선 말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듯이 여인을 안타깝게 했고 말은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여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끌었다. 말은 낮선 언덕을 착실하게 올라갔고 정상이 보이자 말은 맹렬하게 내달았다. 여인은 말의 질풍노도 같은 뜀박질에 환호했다. 리드미칼 한 말의 뜀박질에 따라 소리 지르는 여인의 함성에 여치는 잠시 슬픔의 뜸을 드리며 통곡하던 장소를 옮겼다. 여치의 금속성 울음이 살아진 대신 여인의 음성이 드높았다. 그 음성은 슬픔을 머금은 또 다른 금속성 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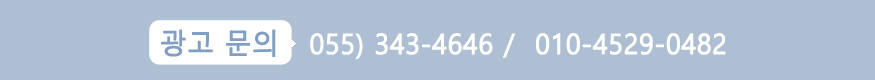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